동그란 얼굴에 행복한 미소 가득 띤 상괭이,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모습의 이 귀여운 녀석은 ‘한국의 인어’라고 불리는 토종 고래 ‘상괭이’다.
보통 고래와 다르게 최대 길이 210cm로,
작은 머리가 둥글고 등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다에서의 활기찬 모습이 아닌 상처투성이 모습, 혹은 죽어서 발견되고 있다.
최근 여수 해역에서 상괭이 1마리가 사체로 발견 됐는데,
이 지역에서만 올해 37구가 발견된 거다.
다른 해역에서도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리곤 하는데..
왜 이렇게 죽어가는 걸까?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서해에 사는 상괭이 수가
3만 6천 마리로 추정됐지만 2011년엔 1만 3천여 마리,
6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개체수 감소로 해양수산부가 2016년부터
상괭이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는데
여전히 매년 1,000여 마리가 죽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오염이나 연안 부근 개발, 특히 ‘혼획’을 문제 삼고 있다.
혼획이란 어업을 할 때 어획 대상 외에 다른 종이 잡히는 걸 말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어업 과정에서 약 1만 5천 마리의 고래가 혼획 됐는데
이 중 상괭이가 3분의 2인 1만 마리나 됐다.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상괭이 서식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어업을 금지하는 거다.
그런데 상괭이가 서식하는 곳은 먹이가 풍부한 곳이다 보니 어업을 금지하면
어민들의 수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상괭이는 주로 안강망이라는 어구에 많이 잡히는데,
안강망은 입구가 넓지만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좁아져 그물에 가두는 어구이다.
먹이를 쫓아 들어간 상괭이는 아가미가 아닌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면 위에서 호흡을 해야 하지만 어구에 갇혀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거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상괭이가 그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구를 개발했다.
하지만 어민들은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며 설치를 꺼리는 분위기다.
동물보호단체는 상괭이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탈출 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래류는 해양생태 먹이사슬의 최상층으로 피라미드를 보호하는 우산종이다.
멸종은 단순히 한 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른 종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럼 결국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오늘 ‘핑거 이슈’는 여기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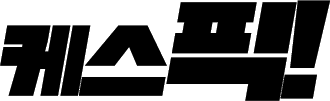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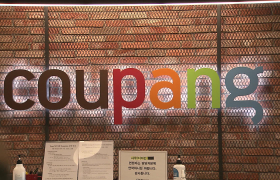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