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인 별난 이야기(남·별·이)'는 남도 땅에 뿌리 내린 한 떨기 들꽃처럼 소박하지만 향기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남다른 끼와 열정으로, 이웃과 사회에 선한 기운을 불어넣는 광주·전남 사람들의 황톳빛 이야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편집자 주>

"무안을 떠나 7년 동안 광주 찍고 서울까지 고향 밖 세상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역무원으로 34년 동안 몸담아 온 정든 철도청을 퇴직한 후 광주작가회의 회장에 이어 서울에서 2년간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직무를 마치고 다시 전남 무안에 귀향한 박관서 시인.
그를 무안문화원 부설 무안학연구소에서 만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에게 지난 7년은 무궁화호 열차에서 KTX로 갈아탄 것 만큼이나 엄청난 문화적 충격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 자유로운 눈으로 세상 바라봐제한된 직장인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폭넓은 시야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박 시인은 "무안을 떠나 있는 동안 사회를 통해 나를 돌아본 성찰의 여정이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무안학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마을조사와 인물탐구 등 지역학 연구에 몰두하는 한편 객지생활 하느라 미뤄두었던 호남선 철도에 관한 서사시 집필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4년 철도와 함께 해온 역무원 생활은 그의 문학의 모태이자 자양분입니다.
사춘기 시절, 시에 눈을 뜬 그는 가정 형편상 일반고 대신 철도고에 진학했고 1983년부터 기적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루 하루 승객들과 부딪히는 일상이지만 문학에 대한 갈망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사춘기 시절 문학에 대한 갈망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으로 원고지를 붙들고 시 한 줄을 토해내기 위해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기는 역무원 생활을 하면서 알토란같은 서정시를 써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을 하면서 시를 쓴다는 것이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와 문학은 영원히 평행선이란 생각을 가졌습니다.

회의감이 깊어갈 무렵 때마침 오랜 옥살이에서 풀려나 강연차 목포에 온 김남주 시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강연 중 "시는 똥이다. 삶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시"라는 한마디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 삶과 밀착된 '문학의 길' 결심삶과 밀착된 온전한 문학의 길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철도에서 시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갑갑했던 직장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편씩 시가 만들어졌고 이를 모아서 '철도원 일기'(2000)와 '기차 아래 사랑법'(2014) 등 2권의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늦은 밤 열 한 시경
구슬땀 배인 입환작업 마치고
싸한 겨울바람에 앞섶을 풀어 맡긴 채
오렌지색 투광기 불빛에 젖어
선로와 선로를 지나 터벅터벅
사무실로 돌아오다 보면
자갈밭 사이사이에 무수히
반짝이는 빛들 빛들이 있어
천천히 살펴보면 사금파리
부서진 돌멩이 구겨진 우유곽들
별 것 아닌 것들의 어깨 위에
눈부신 금가루들 저리 쏟아져 내려
따뜻한 눈빛으로 반짝거린다
어깻죽지 노곤노곤한 이 밤
- 별, 박관서
철도에 관한 시 가운데 가장 대표작이 무엇이냐고 묻자 대뜸 "한편 한편이 모두 눈물이 난다"며 애환을 드러냈습니다.
◇ "철도는 환희와 눈물이 교차하는 공간"시인들이 철도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철도는 근대 문명을 이끈 주역이었다. 그리고 열차와 역은 만남과 이별, 기쁨과 환희, 눈물, 영욕이 교차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서 시적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역무원 재직 당시와 퇴직 후 문학적 변화에 대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재직 중에는 철도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봤다면 지금은 직접 문학을 바라보고 있다. 퇴직 후 한동안 무중력 상태로 지내왔으나 이제는 나의 패턴이 생겨서 나만의 문학을 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요즘 호남선에 관한 서사시를 쓰고자 자료를 모으는 중입니다.
"한국문학에서 서사시가 빈약하다.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 관점에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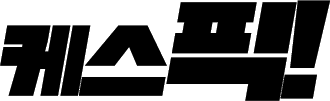











































댓글
(0)